80년대의 LA는 헤비메탈의 천국이었다. 머틀리 크루와 본 조비, 건즈 앤 로지스 같은 ‘본좌’급 밴드들이 난립했고, 화려한 비주얼을 겸비한 이들의 음악은 LA메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는 바로 이처럼 록의 메카로서의 80년대 LA를 배경으로 한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해 바로 이 도시, 이 시대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물론 스토리를 이끄는 인물들은 존재한다. 록스타를 꿈꾸며 하드록 클럽 버번에서 일하는 드류(온유)는 시골에서 상경한 쉐리(문혜원)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시청에서 일하던 레지나(백민정)는 독일에서 온 부동산업자 허츠(문성혁)의 LA 재개발 계획에 맞서 시위대를 조직한다. 허츠의 재개발 때문에 철거 위기에 놓인 버번 클럽은 해체를 앞둔 전설의 록밴드 아스날의 마지막 공연을 유치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만 오히려 상황은 아스날의 리더 스테이시(정찬우) 때문에 악화된다. 스테이시는 쉐리를 유혹해 드류의 가슴에 상처를 주고, 다른 멤버들과의 불화로 공연까지 망친다.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사랑의 위기, 도시의 위기 앞에서 그 어떤 인물도 능동적인 주체가 되지 못한다. 작품 후반,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는 몇 번의 작업만으로 이 모든 일들은 쉽사리 해결되며, 결말은 갈등이 극복된 새로운 국면이라기보다는 다시 원래의 좋은 시절로 돌아가는 회귀처럼 보인다.
노스탤지어를 노래하다
|
| 뮤지컬 <락 오브 에이지>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80년대를 향한 노스탤지어다. |
흥미로운 건, 이러한 회귀적인 플롯이 <락 오브 에이지> 전체를 관통하는 노스탤지어를 더욱 강화한다는 것이다. 비록 작품 안에서 80년대 LA는 현재진행형의 시공간으로 등장하지만 그것을 재구성하는 시선은 다분히 회고적이다. 가령 레지나와 버번 클럽의 로니(김재만)와 데니스(김진수)는 허츠의 재개발 권력에 맞서 록스피릿과 로큰롤을 외치지만 만약 이 장면이 90년대에만 등장했더라도 수많은 록 마니아들은 코웃음을 쳤을 것이다. 앞서 헤비메탈의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 밴드들이 누린 엄청난 상업적 성공을 전제하는 것이다. 매끈한 팝 스타일의 멜로디와 현란한 머리치장으로 상업적 성공을 누린 이들 밴드들은 종종 록스피릿을 망친 주범 취급을 받았고, 건즈 앤 로지스나 스키드 로우의 팬들은 그들이 얼마나 본 조비와 ‘다른지’ 설명해야했다. 하지만 십 수 년의 세월은 여러 디테일을 지우며 하나의 거대한 노스탤지어를 만들어냈고, 그토록 으르렁댔던 메탈리카와 본 조비는 세월의 풍파를 이겨낸 노장이자 형님으로서 동일한 무게감을 얻는다.
<락 오브 에이지> 전체를 수놓는 클래식한 록 넘버들이 LA메탈로만 한정되지 않은 것은 그런 면에서 쉽게 수긍할 수 있다. 물론 스테이시가 등장하며 부른 본 조비의 ‘Wanted Dead or Live’나 아스날의 공연에 쓰인 콰이어트 라이엇의 ‘Cum on Feel the Noize’, 시위대가 부른 트위스티드 시스터의 ‘We`re Not Gonna Take It’처럼 LA메탈을 대표하는 곡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간 중간 익스트림의 ‘More Than Words’나 미스터 빅의 ‘To Be With You’ 같은 90년대 대표 록발라드들도 무리 없이 친숙한 느낌으로 관객에게 다가온다. 즉, <락 오브 에이지>의 80년대 LA가 환기하는 것은 실제 그 시대라기보다는 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까지 수많은 메탈밴드들이 플래티넘을 기록했던 어느 좋았던 시절에 가깝다. 그 시절의 하드록과 메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비록 미국 밴드의 곡이 아니더라도 극 중 로니와 데니스가 부르는 유럽의 ‘The Final Countdown’의 신시사이저 전주에 전율을 느낄만하다. 즉, 극을 이루는 사건의 조각조각에서 중요한 건 이들 곡이 환기하는 정서이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으며 얻은 것은 드류와 쉐리의 사랑이 아닌, 그 좋은 시절 자체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무대 위에는 록 밴드가 있고, 사랑하는 젊은 남녀는 록 공연을 보며 열광하는.
‘떼창’이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이처럼 그 때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킨다는 점 때문에 수많은 하드록, 메탈 넘버에도 불구하고 <락 오브 에이지>는 기대만큼 록킹한 무대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원곡의 멜로디를 살리면서 한국어로 일일이 번안하고, 극의 흐름에 맞춰 곡을 교차로 진행하는 작업은 분명 존중해 마땅하지만 그렇게 변화된 곡들로는 원곡을 후련하게 불러재끼고 싶은 욕구를 해소하기 어렵다. 비록 공연 내내 관객의 호응을 유도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콘서트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하지만 ‘Cum on Feel the Noize’의 후렴구인 ‘Wild Wild Wild’를 따라 부르는 정도를 제외하면 제대로 ‘떼창’을 할 만한 부분은 없다. 그렇다고 음악의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순간, 가령 영화 <더 레슬러>에서 건즈 앤 로지스의 ‘Sweet Child O` Mine’의 전주가 흘러나올 때처럼 소름 돋는 순간을 만들어내지도 못한다. 즉 일종의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다. 그럼에도 여전히 <락 오브 에이지>는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는 작품이다. 작품을 보고 돌아온 날 밤, 기어코 본 조비의 ‘Livin` On A Prayer’를 틀어 따라 부르게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먼지 묻은 비디오테이프를 꺼내 건즈 앤 로지스의 ‘November Rain’ 뮤직비디오를 보며 눈물짓게 만든다는 것만으로도.

![[종합]'파격변신' 이영자, 황동주와 손잡더니…"진짜 마지막 기회다"('오만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F.3938342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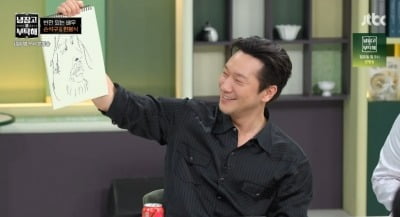
![[종합]이동건, 사진으로 다시 만난 37살 동생 "너무 근사해…"('미우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F.393824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