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이 세상을 바꾸지는 않는다. 하지만 음악이 바뀌던 시절은 있었다. 19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 듀스, 넥스트 등으로 시작된 새로운 음악들의 조류는 당시 전면에 부상하던 새로운 세대의 상징이었고, 그들의 음악은 다시 그 세대를 움직이는 역할을 했다. 그리고 패닉은 그 시대에 ‘청년 음악’이었다. ‘아무도’를 시작으로 ‘달팽이’, ‘왼손잡이’로 이어지는 그들의 음악은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갈 길을 찾지 못하던 동세대의 내적인 고민들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가사로 풀어냈다. 그래서 패닉의 노래를 만들던 이적의 새 앨범 은 그 자체로 역시 시대적이다. 이적은 한 개인이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그것을 회상하는 과정을 그리지만 거기에는 패닉의 노래에 공감했던 세대의 감수성이 그대로 들어있다. 패닉 이후 15년, 또는 1990년대와 2000년대를 거쳐 2010년에 온 한 세대의 이야기.“사랑 노래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

이적 :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다. 노래를 쓰다 보니까 곡들에 맞는 가사들이 사랑 이야기가 많아지더라. 그래서 곡하고 잘 붙어서 사랑 이야기를 곡의 가사로 쓰고, 이러다가 전 곡이 사랑 노래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게 사랑 노래가 아닌 노래들도 있으니까 그런 곡도 해야 하나 싶었다.
이적이라고 하면 사회적인 메시지나 내면의 고민 같은 걸 기대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적 :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그러다가 한 번 쯤 이렇게 가는 것도 정답이 아닌가 싶었다.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사랑 노래를 쓰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패닉 시절에 ‘혀’라는 곡을 만들면 사람들이 그 제목만 듣고도 “와!” 이런 경우도 있었다. 역시 패닉이니까 이런 제목의 노래를 할 수 있다, 사회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고. (웃음) 사람들이 이런 거 할 사람은 너밖에 없다 그러고. 그런데 사랑 노래는 경쟁자도 많고, 독특한 시각을 갖기도 어려우니까 사랑 노래를 만들어보자고 했다.
왜 그렇게 사랑만 생각났나. (웃음)
이적 : 앨범을 들어보면 이별 노래가 많다. 그게 내가 떠오르는 곡들이 쓸쓸한 곡들이 많아서 그런 건데, 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그렇다. 쓰는 곡들이 하~ 이러고 한숨 쉬는 느낌이다.
그러고 보면 온통 사랑노래인데도 앨범에서 사랑의 기쁨을 담은 건 ‘그대랑’ 한 곡 뿐이다.
이적 : 그렇다. 그러다 마지막 곡만 약간 애교로 한 곡 넣고. (웃음) 그래서 아내는 사람들이 오해하겠다고 하더라. 결혼 전에는 ‘다행이다’ 부르더니 결혼하고 나서는 슬픈 사랑노래만 나온다고. (웃음) 요즘 작업실을 내고 혼자 좁은 공간에 있으니까 드는 고독함 때문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앨범이 회고적인 분위기가 강한 것 같다. 첫 곡 ‘아주 오래 전 일’도 회고적인 노래고. 지금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시절을 돌아보는 것 같다.
이적 : 그렇게 되더라. 왜 그럴까? (웃음)
“사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소박함에 관심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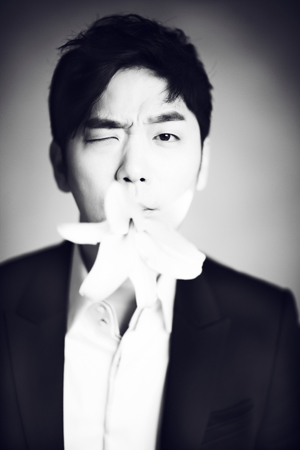
이적 : 그 말 괜찮은데? (웃음) 맞아. 옛날에는 헤어지면 죽을 것 같아 이랬지, 빨래를 해야겠다고는 안 했으니까. (웃음) 그런 생각을 일부러 한 건 아닌데, 가사를 쓰면서 어려운 말 대신 일상의 말을 많이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부러 기발한 표현을 쓰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가사를 썼다. 예를 들어 ‘매듭’ 같은 곡은 매듭이라는 단어를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노래에 가사를 붙이면서 나도 모르게 툭 나오는 말을 썼다. 매듭? 왜지? 이러면서. 그러면 아, 그래 매듭을 갖고 이어가 볼까? 이렇게 된다.
그만큼 소소한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됐기 때문 아닐까.
이적 : 요즘은 거대한 담론이나 어떤 문제제기를 해야겠다는 생각 보다는 사는 것, 사랑하는 것에 대한 소박함에 관심이 생겼다.
‘혀’나 ‘밑’을 부르던 패닉 시절이 십 수 년 됐으니까, 또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을 것 같기도 하다.
이적 : 그래서 패닉 2집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 사람 너무 아저씨의 음악을 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그 때 했던 음악도 내 음악이다. 그런데 지금 그런 노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지금의 나로서는 그게 인위적으로 설정해서 만드는 음악이 될 것 같다. 내가 이런 사회적인 노래를 만들어볼 테니까 들어봐, 이러면 주목은 받을 수 있겠지만 노래는 메시지를 주는 역할 말고도 공감을 받고 위안을 주는 역할이 있지 않나. 갈수록 그런 노래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음악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건가. 몇 년 전의 패닉 3집이나 솔로 1, 2집 때와는 음악에 대한 태도가 또 다른 것 같다.
이적 : 이를테면 패닉 시절의 ‘달팽이’나 ‘기다리다’ 같은 노래를 지금 공연에서 불러도 자연스럽다. 하지만 ‘혀’를 공연에서 다시 부르면 나 스스로 생뚱맞아 보인다. 그 노래를 부르려면 무대 연출이나 앞뒤에 들어가는 곡에서 더 많은 설정들이 들어간다. 물론 그런 음악도 굉장히 즐겁게 했지만, 음악 중에는 15년이 지나서 그 때도 여전히 같은 울림을 갖고 있는 노래도 있으니까. 요즘은 그런 음악을 하고 싶었다. 예전에는 분노, 공격성 이런 것들을 가진 곡들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슬픔 같은 게 반영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타인의 잘못에 대해 “쟤 뭐야” 하면서 이해 못했을 것 같은 것들이 요즘에는 이해를 하고 짠해질 때가 있다. 그런 게 반영되는 것 같다.
“가사가 안 들려도 만족을 주는 곡을 쓰고 싶다”

이적 : 뮤지션들 중에는 이번에 무슨 곡에는 어떤 사운드가 들어갔어, 어떤 부분이 죽여 이런 분들도 있다. 그 분들은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다. 반대로 나는 60-70년대 음악, 그런 음악도 좋은 음악은 여전히 좋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트렌드에서 떨어져서 내 음악을 들었을 때 이거 몇 년도에 나온 음악이냐고 물어볼 만큼 감을 잡을 수 없는 음악들을 하고 싶다.
음악 자체의 완성도에 더 집중하게 됐다는 건가.
이적 : 그런 것도 있다. 음악 자체로서, 가사가 안 들려도 만족을 주는 곡을 쓰고 싶다. 이적이 이런 가사를 썼다니 너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음악 위에 가사가 있고, 그게 음악에 더 좋은 느낌을 주는 곡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이 앨범은 들어보면 가사를 먼저 쓴 것 같다. 사랑이라는 콘셉트도 그렇고, 곡의 편곡도 가사의 흐름에 따라 정확하게 변화한다.
이적 : 내 노래 듣고 많은 분들이 그런다. 하지만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 가사를 쓰기 전, 작곡을 하는 순간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될 거라고 떠오른다. 다른 사람의 노래에 작사를 할 때도 음악을 들었을 때 느끼는 첫 인상이나 계속 들었을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서에 따라서 가사를 쓴다. 그러다보면 노래에 따라 스토리가 있으면 좋을 때도 있고, 곡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중요할 때도 있다. 굳이 설명하자면 어느 순간 떠오른다. 그걸 쓰는 거다.
사진제공. 뮤직팜
글. 강명석 two@
편집. 이지혜 seven@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안현모와 이혼' 라이머, 재혼 욕심 드러냈다…"올해 좋은 짝 만나고파"('핸썸가이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F.3938234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