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터테인먼트 전문 미디어 텐아시아가 ‘영평(영화평론가협회)이 추천하는 이 작품’이라는 코너를 통해 영화를 소개합니다. 현재 상영 중인 영화나 곧 개봉할 영화를 영화평론가의 날카로운 시선을 담아 선보입니다. [편집자주]

외계인이 지구를 점령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들은 인간의 시각을 유린해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드는 존재들인데, 눈을 통해 일차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는 인간의 속성에 비춰볼 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눈을 가리는 것 아니겠는가. 용감한 여인 말로리(산드라 블록)에게 주어진 잔인한 과제다. 하지만 그 정도로 놔두어서는 영화가 심심해질 게 분명하니 보다 어려운 조건들을 첨가시켜야 한다. ‘버드 박스’를 스릴러로 분류할 수 있는 근거다.
‘버드 박스’는 같은 해에 만들어진 ‘콰이어트 플레이스’와 많이 닮았다. 혹시 연작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 ‘콰이어트 플레이스’에 나오는 외계인들은 청각에 민감해 소리만 내지 않으면 용케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 스릴러 작품으로서 전개되는 상황이나 생존 방법이나 한계극복 설정까지 두 영화가 아주 비슷하다. 또 기억나는 작품으로 세 해 전에 만들어진 ‘클로버필드 10번지’를 꼽을 수 있다. 그렇게 다른 영화들과 비록 설정은 유사하나 ‘버드 박스’에는 요즘 유행과 한 묶음으로 볼 수 없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멜로니가 처음 경험한 공동체는 외계인의 위험에 맞서 오직 생존만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위기에 놓인 사람들은 각각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 도움을 이용하는 사람, 나 몰라라 외면하는 사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공동체는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리고 만다. 특히 더글라스(존 말코비치)와 그레이(톰 홀랜더)의 인물 설정이 좋았다. 그런 허약한 공동체에 비해 영화 마지막에 등장하는 공동체는 혼란과 공포의 상황에서 대안적인 성격을 갖는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다양한 나이 대에 다양한 인종이 서로 도와주는 곳, 안대가 필요 없는 세상, 이들을 지켜주는 방어벽은 나무와 울창한 덩굴이고 새들은 위험을 경고한다. 말하자면 자연이 인류를 지켜주는 셈이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말 없기를 바란다!) 설혹 지구 파괴를 노리고 외계인이 침공해 오더라도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다.
영화를 단순한 스릴러가 아니라 숨은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추측한 이유는 감독인 수잔 비에르 때문이었다. 비에르 감독의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수상작인 ‘인 어 베러 월드’(2010)와 일맥상통하는 맥락을 발견했는데, 바로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집요한 추구이다. ‘인 어 베러 월드’에서는 불의한 폭력에 마주할 때 개인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하는지 다각도에서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복수의 포기’라는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해 감독이 혼신의 힘을 기울인다. 주제에 대한 감독의 집요함을 ‘버드 박스’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다. 사회적으로 무시당하는 약자들과 힘을 합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요즘은 어찌된 셈인지 다들 영화를 쉽게 만들려 한다. 영화 시작 5분 내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청소년 관객의 성향에 맞추어 심각한 문제의식이 실리면 안 되고, 가능한 한 눈길을 사로잡는 예고편을 만들어 미리미리 흥행을 준비한다. 언론 플레이에 물 쓰듯이 돈을 쏟아 붓는다. 그래서 얻은 결과로 제작사는 돈방석에 앉고 감독의 흥행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획득한다. 걱정되는 일이다.
우리나라에서 감독의 전작 ‘인어 베러 월드’는 탁월한 작품성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하고 말았다. 관객의 구미를 맞추지 못한 탓인데, 사실 그런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아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그에 비해 오랜만에 만난 비에르 감독의 ‘버드 박스’는 보는 재미가 상당하다.
영화의 제목인 버드 박스(Bird Box)는 야생의 새들이 거주 할 수 있는 ‘새집’을 뜻한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실제로 새를 담은 종이 박스가 등장한다. 이 새들이 어떻게 다시 자유를 찾는지 살펴보면 작품의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박태식(영화평론가)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파격변신' 이영자, 황동주와 손잡더니…"진짜 마지막 기회다"('오만추')](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F.39383427.3.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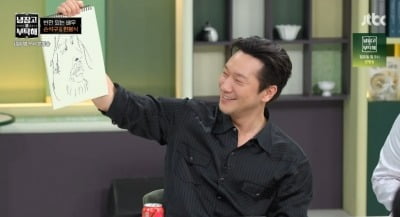
![[종합]이동건, 사진으로 다시 만난 37살 동생 "너무 근사해…"('미우새')](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BF.3938246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