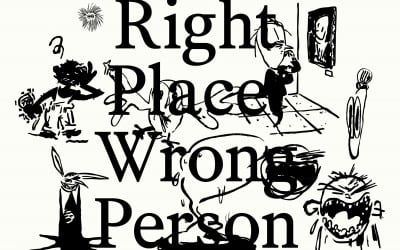“나는 그를 알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에 관한 글을 썼으면 싶다. 아마 그 중 나의 기록이 가장 짧고, 가장 보잘것없을 것이다.”
‘공식적인’ 추모기간은 이제 끝났다. 겸연쩍게 슬슬 귀환하고 있는 TV의 오락프로그램들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없는(그렇다, 이번 비극 앞에서 나의 만화 나부랭이를 비롯해서 웬만한 건 죄다 실없는 것이다) 유머에 실없는 웃음이 픽 새나왔다가도 아직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자신의 경박함을 황망히 거둬들이는 건 모르긴 해도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가슴을 치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우리는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첫머리에 쓴 글은 내 말이 아니고 보르헤스의 <픽션들>에 실린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일부이다. 실은 이 작품은, 적어도 내 생각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저 모든 걸 너무나 빨리 잊곤 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는 이레네오 푸네스가 떠올랐을 뿐이다.
“우리는 한 번 쳐다보고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세 개의 유리컵을 지각한다. 그러나 푸네스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모든 잎사귀들과 가지들과 포도알들의 수를 지각한다. 그는 1882년 4월 30일 새벽 남쪽 하늘에 떠 있던 구름들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 구름들과, 단 한 차례 본 스페인식 장정의 어떤 책에 있던 줄무늬들, 그리고 께브라초 무장 항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네그로 강에서 노가 일으킨 물결들의 모양을 비교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푸네스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면 아마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2009년 5월 23일을 기억하며 울고 분노하고 미안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그 날의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질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라틴어를 습득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곤 했다. 사고를 한다는 것은 차이점을 잊는 것이며, 또한 일반화를 시키고 개념화를 시키는 것이다. 푸네스의 풍요로운 세계에는 단지 거의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세부적인 것들밖에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머지않아 오락프로도 보고 이효리 비키니도 보고 실없는 짓들을 잔뜩 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다행히 푸네스 같은 천재도 못했던 일반화 개념화 같은 건 좀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공식적인’ 추모기간이 끝나자마자 일반화 개념화하기 쉽도록 일이 아주 심플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정한 기간에 정한 방식대로만 추모하라. 손에 뭘 들어도 되는지 가방에 무슨 색 물건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 추억은 어디서 나눠야 하는지 정해주는 대로 하라.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써놓고 그들은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읽는 모양인데, 과문한 탓인지 나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독재’라고 밖에는 읽지 못하겠다. 틀림없이,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지금의 슬픔을 꽤 많이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 보게 된 수많은 일들을 일반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진짜로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큰 상관이 없는 소설이다. 이 글을 보고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기대하며 그 작품을 읽는다면 본편과 완전 딴판인 예고편에 낚여 엉뚱한 영화를 보게 되는 시추에이션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싱크로율 100%인 시대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르헤스를 (다시) 읽는 건 나름 괜찮은 일인 것 같다.
글. 올드독
‘공식적인’ 추모기간은 이제 끝났다. 겸연쩍게 슬슬 귀환하고 있는 TV의 오락프로그램들을 나무랄 수는 없을 것이다. 실없는(그렇다, 이번 비극 앞에서 나의 만화 나부랭이를 비롯해서 웬만한 건 죄다 실없는 것이다) 유머에 실없는 웃음이 픽 새나왔다가도 아직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 자신의 경박함을 황망히 거둬들이는 건 모르긴 해도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 가슴을 치며 다짐했던 약속들을 우리는 정말 지킬 수 있을까. 첫머리에 쓴 글은 내 말이 아니고 보르헤스의 <픽션들>에 실린 단편 ‘기억의 천재 푸네스’의 일부이다. 실은 이 작품은, 적어도 내 생각엔 노 전 대통령의 서거와는 거의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그저 모든 걸 너무나 빨리 잊곤 하는 스스로에 대해 자신이 없어 ‘가장 오래되고, 가장 사소한 것까지도 기억’하는 이레네오 푸네스가 떠올랐을 뿐이다.
“우리는 한 번 쳐다보고서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세 개의 유리컵을 지각한다. 그러나 푸네스는 포도나무에 달려 있는 모든 잎사귀들과 가지들과 포도알들의 수를 지각한다. 그는 1882년 4월 30일 새벽 남쪽 하늘에 떠 있던 구름들의 형태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그 구름들과, 단 한 차례 본 스페인식 장정의 어떤 책에 있던 줄무늬들, 그리고 께브라초 무장 항쟁이 일어나기 전날 밤 네그로 강에서 노가 일으킨 물결들의 모양을 비교할 수 있었다.”
만약 우리가 푸네스 같은 능력의 소유자라면 아마 쉽게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2009년 5월 23일을 기억하며 울고 분노하고 미안해할 수 있을 것이다. 평생 그 날의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질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우리는 그렇지가 못하다.
“그는 전혀 힘들이지 않고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라틴어를 습득했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곤 했다. 사고를 한다는 것은 차이점을 잊는 것이며, 또한 일반화를 시키고 개념화를 시키는 것이다. 푸네스의 풍요로운 세계에는 단지 거의 즉각적으로 인지되는 세부적인 것들밖에 없었다.”
어쨌든 우리는 머지않아 오락프로도 보고 이효리 비키니도 보고 실없는 짓들을 잔뜩 하며 살아가게 되겠지만, 다행히 푸네스 같은 천재도 못했던 일반화 개념화 같은 건 좀 할 줄 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공식적인’ 추모기간이 끝나자마자 일반화 개념화하기 쉽도록 일이 아주 심플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내가 정한 기간에 정한 방식대로만 추모하라. 손에 뭘 들어도 되는지 가방에 무슨 색 물건을 넣지 말아야 하는지 추억은 어디서 나눠야 하는지 정해주는 대로 하라.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써놓고 그들은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읽는 모양인데, 과문한 탓인지 나는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독재’라고 밖에는 읽지 못하겠다. 틀림없이, 그리 멀지 않은 때에 우리는 지금의 슬픔을 꽤 많이 잊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 뒤에 보게 된 수많은 일들을 일반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에서 어쩌면 진짜로 약속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다시 말하지만 ‘기억의 천재 푸네스’는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큰 상관이 없는 소설이다. 이 글을 보고 노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을 기대하며 그 작품을 읽는다면 본편과 완전 딴판인 예고편에 낚여 엉뚱한 영화를 보게 되는 시추에이션과 비슷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과 싱크로율 100%인 시대를 어떻게든 살아가야 하는 입장에서 보르헤스를 (다시) 읽는 건 나름 괜찮은 일인 것 같다.
글. 올드독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이제훈, 인질 된 서은수 구출…다이내믹 팀플레이 '최고 12.9%'(수사반장)](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43302.3.jpg)
![삼성도 LG도 싫다…허성태→진기주, 대기업 관두고 '리스크 안은 도전'[TEN피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37343.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