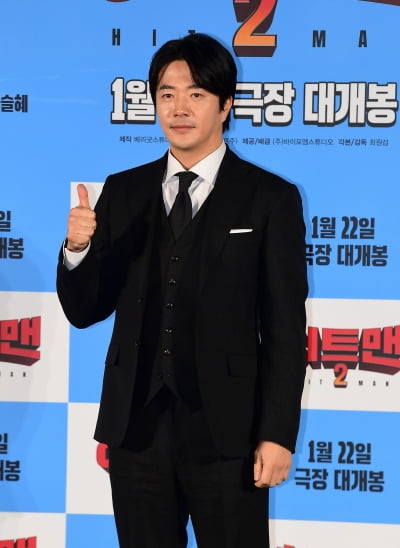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말은 제주로 가라고 했던가. 도포자락 나부끼며 보무당당하게 탐라에 입성한 MBC <탐나는 도다>의 사대부 도련님은 귀양살이 처지에도 꼿꼿한 고개를 꺾는 법이 없었고, 제주의 바닷가에서 청춘의 한 철을 보낸 배우는 드디어 해사한 얼굴이 아닌 빳빳한 목소리와 뚜렷한 걸음걸이에 어울리는 역할을 찾았다. 제주의 바위틈과 들판에서 비로소 빛을 발하는 임주환은 그래서 말 같은 배우다. 호리호리한 신체와 말간 눈빛으로 일각수를 떠올리게 하는 외모를 조금만 가리면 이내 알게 된다. 사실 십년 째 연기자가 되기 위해 내달려 온 이 청년의 심장은 경주마의 그것처럼 펄떡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학로에 극장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
“수업을 4교시까지 듣고 나면 오후에는 그냥 연극 대본을 읽어도 괜찮았어요. 학교 방범 시스템이 작동될 때까지 체육관에 남아서 연습을 할 정도였거든요.” 말투에는 너스레가 묻어나지만,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임주환의 목소리는 제법 진지하다. 고3이 되던 해 ‘전국 청소년 연극제’ 참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연극은 흥미도 취미도 특별히 없었던 소년을 열병처럼 사로잡아 버렸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도록 연극을 보러 대학로를 누볐고, 두발 3cm의 교칙에 ‘연극반 예외’라는 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재수 시절에도 일 년 내내 고등학교 연극반 후배들을 지도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였다. “그때 애들이 잘했어요. 단체상, 지도상도 받고 그랬었거든요”라고 여전히 그 시절을 뿌듯해 하는 얼굴에는 문득 기세등등하게 제 세상의 문을 연 소년의 희망이 스친다. 그리고 “그 시절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대학로에 극장을 만들자. 우리도 모여서 공연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제 힘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라고 아직도 그 희망의 색깔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청년의 얼굴은 꿈의 빛으로 싱싱하다.
“넌, 그냥 박규다”
물론 언제나 그가 직진으로 내달린 것은 아니었다. 학교 선배였던 예학영의 권유로 시작한 모델 일은 그에게 좋은 일거리와 아름다운 동료들을 주었다. 그리고 모델 선배들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다시 한 번 임주환은 소년시절 힘차게 열었던 그 문의 고리를 손에 쥐었다. 학생과 의사, 도련님의 비슷한 얼굴이 겹쳐지는 와중에 자신의 좌표를 그려 넣었던 청년은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앞에 두고 “에휴. 나는 안되겠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옥션 하우스>의 맹인 화가, <종합 병원2>의 치질환자를 자청하며 한 뼘씩 범주를 넓혀 왔지만 20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렇게 감히 탐내기조차 어려울 만큼 간절한 자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조차 냉정한 그 시선이야말로 사대부 어사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고, 덕분에 제작진은 임주환에게서 박규의 현현을 보았다. “송병준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넌, 그냥 박규다.”
약간의 다혈질, 무서운 집중력, 그리고 만만찮은 고집까지 영락없이 박규와 닮아 있는 임주환은 그래서 매일매일 “녹초가 될 때까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삼복더위에 행전을 차고 상투까지 틀고 있자니 살이 빠질 지경이지만 아랑곳 않는다. 달리는 말은 옆을 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술 질문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건만, 이 청년에게 연기 이외의 이야기를 물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곳에 빠지면 다른 건 신경도 안 써요.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 엔딩을 볼 때까지 조이스틱을 손에서 놓질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안하는 게 많아요. 빠질까 봐요. 오죽하면 아직 스키를 한 번도 안타봤다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전소하는 배우의 발견을 기뻐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크게 환호해도 좋겠다. 아직 경주마의 곁눈은 단단히 가려져 있다.
글. 윤희성 (nine@10asia.co.kr)
사진. 이진혁 (eleven@10asia.co.kr)
편집. 이지혜 (seven@10asia.co.kr)
대학로에 극장을 세우는 것이 꿈이었던 소년
“수업을 4교시까지 듣고 나면 오후에는 그냥 연극 대본을 읽어도 괜찮았어요. 학교 방범 시스템이 작동될 때까지 체육관에 남아서 연습을 할 정도였거든요.” 말투에는 너스레가 묻어나지만, 학창시절을 기억하는 임주환의 목소리는 제법 진지하다. 고3이 되던 해 ‘전국 청소년 연극제’ 참여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세상의 전부가 되어버린 연극은 흥미도 취미도 특별히 없었던 소년을 열병처럼 사로잡아 버렸다. 출석 일수가 모자라도록 연극을 보러 대학로를 누볐고, 두발 3cm의 교칙에 ‘연극반 예외’라는 허가를 얻어내기도 했다. 심지어 재수 시절에도 일 년 내내 고등학교 연극반 후배들을 지도하며 시간을 보낼 정도였다. “그때 애들이 잘했어요. 단체상, 지도상도 받고 그랬었거든요”라고 여전히 그 시절을 뿌듯해 하는 얼굴에는 문득 기세등등하게 제 세상의 문을 연 소년의 희망이 스친다. 그리고 “그 시절 친구들이랑 약속을 했어요. 나중에 대학로에 극장을 만들자. 우리도 모여서 공연을 하고, 고등학생들이 제 힘으로 연극을 무대에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라고 아직도 그 희망의 색깔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청년의 얼굴은 꿈의 빛으로 싱싱하다.
“넌, 그냥 박규다”
물론 언제나 그가 직진으로 내달린 것은 아니었다. 학교 선배였던 예학영의 권유로 시작한 모델 일은 그에게 좋은 일거리와 아름다운 동료들을 주었다. 그리고 모델 선배들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으로 노선을 변경하면서 다시 한 번 임주환은 소년시절 힘차게 열었던 그 문의 고리를 손에 쥐었다. 학생과 의사, 도련님의 비슷한 얼굴이 겹쳐지는 와중에 자신의 좌표를 그려 넣었던 청년은 드라마의 주인공 역할을 앞에 두고 “에휴. 나는 안되겠네”라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 <옥션 하우스>의 맹인 화가, <종합 병원2>의 치질환자를 자청하며 한 뼘씩 범주를 넓혀 왔지만 20부작 드라마의 주인공은 그렇게 감히 탐내기조차 어려울 만큼 간절한 자리였던 것이다. 하지만 자신에게조차 냉정한 그 시선이야말로 사대부 어사에게 필요한 덕목이었고, 덕분에 제작진은 임주환에게서 박규의 현현을 보았다. “송병준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넌, 그냥 박규다.”
약간의 다혈질, 무서운 집중력, 그리고 만만찮은 고집까지 영락없이 박규와 닮아 있는 임주환은 그래서 매일매일 “녹초가 될 때까지” 에너지를 쏟아 붓는다. 삼복더위에 행전을 차고 상투까지 틀고 있자니 살이 빠질 지경이지만 아랑곳 않는다. 달리는 말은 옆을 보지 않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술술 질문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건만, 이 청년에게 연기 이외의 이야기를 물어 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한 곳에 빠지면 다른 건 신경도 안 써요. 롤플레잉 게임을 하면 엔딩을 볼 때까지 조이스틱을 손에서 놓질 않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안하는 게 많아요. 빠질까 봐요. 오죽하면 아직 스키를 한 번도 안타봤다니까요.” 카메라 앞에서 전소하는 배우의 발견을 기뻐하고 있었다면, 조금 더 크게 환호해도 좋겠다. 아직 경주마의 곁눈은 단단히 가려져 있다.
글. 윤희성 (nine@10asia.co.kr)
사진. 이진혁 (eleven@10asia.co.kr)
편집. 이지혜 (seven@10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