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를 요약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노비를 ㅉㅗㅈ는 자’를 의미하는 제목은 낯선 소재의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를 설명하는 일은 쉽지 않다. 병자호란 이후라는 뚜렷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지만 인물들은 역사적 사건에서 자유롭고, 그렇기에 사건을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가 아닌 개인의 욕망이다. 덕분에 결말을 지어놓고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생생함을 부여하는 것으로 완성도를 평가받던 사극과 달리 는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의 힘을 동력으로 삼는다. 임금도 요부도 없는 사극이자, 실장도 신데렐라도 없는 픽션이라는 새로운 바탕이 흥미를 자아내는 것은 그래서다. 여기 라는 신세계로 들어가는 다섯 개의 열쇠를 공개한다. 완벽하게 만들기도, 완전하게 해석하기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드라마를 보다 잘 즐기기 위한 다음의 힌트들이 반갑다면, 이제 ‘태정태세문단세’를 외우며 사극을 보던 시대에는 작별을 고할 때다.

물론, 에도 실존 인물은 등장한다. 조선 최고의 무장이던 태하(오지호)는 병자호란 이후 소현세자를 모시고 청나라로 향한다. 그러나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소현세자라는 역사가 사라지고 난 뒤부터다. 신분을 잃고 관노가 된 그는 노비라는 신분을 운명이 아닌 일생일대의 위기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도주를 감행한다. 반면, 양반가의 자식이던 대길(장혁)은 가문의 몰락 후 스스로 추노꾼의 삶을 선택한다. 그가 양심과 신념을 떠나 노비를 ㅉㅗㅈ는 일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 들였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혜원(이다해)은 타인에 의해 자신의 인생이 휩쓸려 가는 인물이다. 이처럼 는 각 인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조차도 개인의 성격과 결부되어 있다. 덕분에 어떤 롤모델도 없는 온전히 새로운 캐릭터를 받아든 배우들은 스스로 인물을 완성하는 재미에 심취해 있다. “극 중에서 대길과 혜원이 만나는 것은 중반 무렵이다. 그러나 그들 사이에는 이미 과거의 사연이 있기 때문에 둘이 만났을 때 낯설어 하는 분위기가 엿보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전작을 함께 해서 친분이 있는 이다해를 혜원 역에 추천했다. 한국 무용을 오래해서 고전적인 자태가 어울릴 것 같기도 했고”라는 장혁의 말은 인물뿐 아니라 관계까지도 고려하며 배역에 몰입중인 그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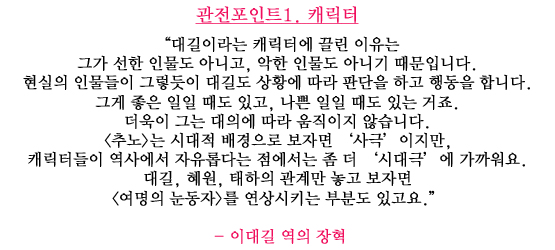
ㅉㅗㅈ는 자와 ㅉㅗㅈ기는 자의 이야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안에서 대립하고 있는 것은 대길과 태하만은 아니다. 그래서 태하와 대립하는 철웅(이종혁)은 이야기가 한참 진행되도록 대길과 만나지 못하고, 대길과 중요한 관계를 맺게 되는 업복(공형진)은 태하와 좀처럼 마주치지 않는다. 구심점을 갖기보다는 횡으로 넓게 이야기들을 펼치는 특유의 스타일을 고수하는 곽정환 감독은 “주인공 한사람에게 이야기를 집중시키지 못하는 것은 종종 지적받는 내 연출의 약점이다. 자칫 산만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하고 반성하기는 한다. 그러나 사회와 환경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결정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주변 인물까지도 다 끌고 갈 수 밖에 없다”며 자신의 문법에 대한 신뢰를 밝혔다. 덕분에 철웅은 단순한 악인으로 설정되는 대신 노모를 모시고 사는 효자인 동시에 끝없는 열등감 덕분에 비뚤어져 버린 인물로서 입체적인 스토리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작은 이야기들이 단단하게 제 모양을 갖출수록 큰 이야기가 완성되는 순간의 폭발력은 한층 강력해질 것을 기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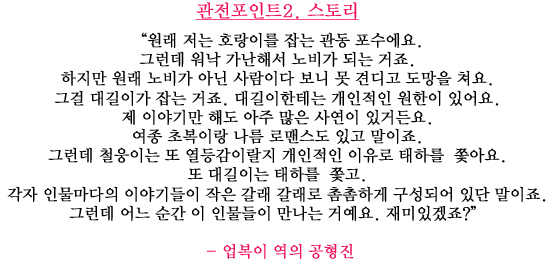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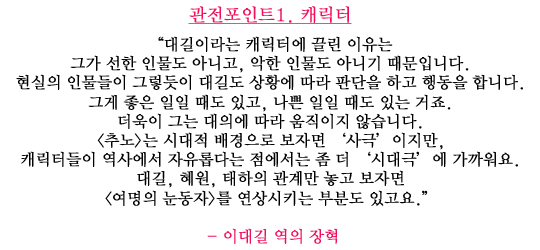
일찌감치 제작을 시작한 덕분에 방영 직전 는 10회 분량의 촬영을 마무리 지었다. 5개월간 제작진은 서울부터 제주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볐으며, 이것은 극 중의 추노패가 추격을 하는 여정을 재현한 것이었다. 이러한 수고에 대해 김종연 조감독은 “추격이 포인트인 드라마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장감이다. 섭외가 어려운 고택의 경우 한 집에서 여러 장면을 소화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데, 아무리 앵글을 틀어도 실감을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욕심을 냈다. ㅉㅗㅈ고 ㅉㅗㅈ기는 느낌을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지도를 펼쳐놓고 장소를 물색해야만 했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덕분에 제작진은 최장군 역의 한정수가 “한국에도 사막이 있더라구요”라며 놀라움을 표현한 강변을 비롯해, 제작진이 “한국에 이렇게 음침하고 음산한 곳이 있었나 놀랄 정도로 이국적인 장소”라고 자랑한 포천의 비둘기낭 등 다양한 한국의 풍광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현대의 느낌을 지우고, 사라진 자연의 웅장함을 덧입히는 CG작업을 통해 는 ‘보는 드라마’로서의 장점을 십분 발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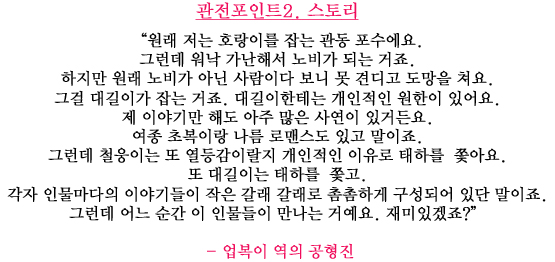

이야기가 개인의 차원으로 내려오면, 드라마는 전쟁이 아닌 싸움을 그려내야 한다. 그래서 곽정환 감독은 에 대해 “조선시대 상놈들의 맨 몸뚱이 이야기”라고 요약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는 “천쪼가리 하나 걸친 육체성을 부각”시키고 “스케일보다는 템포”로 싸움의 움직임을 포착하고자 한다. “레드원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으로 화제가 되었는데 사실 이 장비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고속 촬영이 된다는 점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의 액션은 배우가 직접 만들어내는 동작 자체에 집중한다. 그리고 이는 곧, 액션을 소화하는 배우의 몫이 그만큼 커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곽정환 감독은 “아날로그적인 액션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스턴트를 직접 소화할 수 있는 장혁과 오지호는 탁월한 캐스팅”이라며 배우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특히 김종연 조감독은 “장혁은 테크닉 뿐 아니라 감정 표현까지 능하다는 점에서 액션 연기에 있어서 최고의 배우”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에 더해 “나는 삼보방포의 인물이다. 세 번 걷고 한 번 총을 쏘는데 명사수라서 직접 몸으로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대신 철웅은 월도를 들고 관운장처럼 멋지게 등장한다”는 공형진의 설명을 들으면 의 액션은 리얼함에 더해 다채로움까지도 기대하게 만든다.


의 유쾌한 순간들은 윤문식, 이한위, 안석환, 조진웅, 조희봉 등 코믹 연기에 탁월한 조연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일정부분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이렇게 자유롭게 연기할 수 있는 건 처음이에요. 연기의 앙상블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추노패의 막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울 정도로 저희 셋이 딱 서있으면 너무 멋지게 보일 정도에요”라고 드라마에 합류한 기쁨을 말하는 김지석의 각오를 더하면 가 무거운 주제에 짓눌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사그라든다. 실제로 제작발표 현장에서 한정수는 “왕손이가 대단한 바람둥이로 나오는데, 김지석의 연기가 너무나 실감이 난다. 그건 역시 연기가 아닌 실생활이기 때문 아니겠나”라는 짓궂은 장난으로 촬영 현장의 즐거운 분위기를 이어갔고, 이에 김지석은 극중의 왕손이처럼 투정을 부리는 것으로 대응을 하기도 했다. “원래 조선시대에는 남자들이 손윗사람을 지칭할 때 쓰던 말”이라는 진지한 설명을 덧붙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수가 장혁을 “언니”라고 부르는 장면은 의도치 않은 웃음을 선사하기도 한다. 아무리 ‘인간 사냥꾼’을 둘러싼 아픈 이야기를 그린다 하더라도 약간의 당의정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장면이 억지스럽지 않게 녹아들 수 있다면, 웃음의 빛은 비극의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어 주는 좋은 조명이 될 수 있는 법이다.
사진제공.KBS
글. 윤희성 nine@10asia.co.kr
편집. 장경진 three@10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TEN포토]김수현 '화려한 외출'](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21717.3.jpg)
![[TEN포토]김수현 '오늘도 멋짐'](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2171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