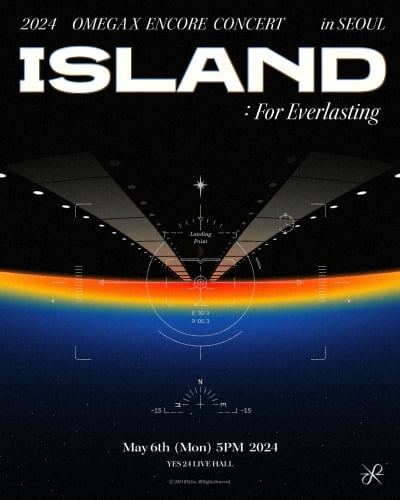벌써 10월이다. 내년 까지 3달 밖에 남지 않는 오늘, 엄지원에겐 바람이 있다. 영화 ‘소원’의 따스함이 관객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그만큼 엄지원은 진심을 담아 미희 역을 구축했다. 옷차림부터 말투, 행동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연기가 아닌, 진짜 소원이의 엄마가 될 수 있었다.Q. 아직 아이가 없는 입장에서 엄마, 아내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어려웠을 것 같다.
‘소원’은 무거운 소재를 다룬다. 아동 성폭행라는 소재가 불편해서 영화를 보는 것이 꺼려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2년 전 엄지원도 영화의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같은 마음이었다. 그런데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를 촬영하던 중, 송윤아의 추천으로 엄지원은 결국 이 영화에 출연 하게 됐다. 무엇이 엄지원의 마음을 움직였을까.
엄지원: 풀어야할 숙제였고 배우로서 잘 해내야하는 미션이었다. 미희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쌓아보려고 노력했다. 말투, 태도, 행동 하나씩 구축해 가면서. 책(시나리오) 속의 미희, 내가 생각한 미희는 순박하고 무뚝뚝한 경상도 여자지만 굉장히 좋은 여자이다. 남편과도 보통 사람들처럼 지낸다. 마음속에 정은 있겠지만 ‘밥 묵었나?’. ‘자라’ 이런 말을 툭툭 던진다. 아이에 대해서는 보통 엄마가 가지고 있는 각별한 마음은 있지만 사교육을 시키는 열성적인 엄마는 아니다. 미희라는 사람이 그려지고 나니까 엄마, 아내의 연기를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다.
Q. 혹시 미희의 옷도 직접 신경을 쓴 건가?
엄지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맞다! 이 여자가 집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를 생각해봤다. 이 사람이라면 딱히 ‘내 옷’은 없을 거 같고, 남편이 입던 낡은 옷을 입는 사람이었을 것 같았다. 일상생활에서의 흐트러진 느낌이 옷에 많이 남았으면 했다. 의상 팀에서 준비한 옷들은 인위적으로 낡은 느낌을 내려다보니까 생활의 때가 옷에 덜 묻어있는 느낌이 났다. 그래서 내 옷 중에 버려야하는 옷들, 나의 때가 묻은 옷들을 입었다.
Q. 소원의 역할을 맡았던 이레 양은 지금 아직 어린 8살인데, 호흡은 어땠나.
엄지원: 잘 맞았다. 이레는 아이로서 사랑스러움과 배우로서의 근성이 잘 섞여있어서 촬영할 때 많이 힘들지 않았다. “어? 아이가 어떻게 저런 걸 하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Q. 이레양은 신기하게도 어른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
엄지원: (손뼉을 치며) 아가씨 얼굴이다! 감정이나 표정 같은 것도. 재미있었던 게 치료 받는 장면에서 이레의 얼굴이 어른처럼 변했더라. “촬영하면서 애가 너무 큰 거 아니야, 갑자기? 어떻게 하냐? 애가 얼굴이 변했다”라고 (설)경구오빠랑 얘기했다.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분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으니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거다. 그런 감정들과 자신이 외운 감정들이 만나서 그런 얼굴이 나온 것 같다. 퇴원을 하고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초반의 이레 얼굴로 돌아오더라.

엄지원: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마음에 쑥 들어왔던 장면이 두 개가 있었다. 하나는 병실에 입원하고 있을 때 친구와 웃다 우는 장면, 두 번째는 상담사에게 미희의 속마음을 전달하는 장면이 좋았다. 미희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누구한테도 털어 놓지 못했던 자기의 마음을 친한 사람이 아닌 타인에게 처음으로 털어 놓는다. 나의 진짜 비밀, 상처는 오히려 타인에게 툭 던지면서 털어 놓을 수 있는 것 같다. 엄마에게도 치유의 시간이 필요한데, “미희가 괜찮아지는 구나”라고 느꼈다. (그 대사롤 통해) 그녀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자고 일어나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였고, 그 말을 통해서 그래도 삶을 이어가야한다는 의지를 들어냈던 것 같다.
Q. 무거운 소재였던 만큼 촬영장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엄지원: 정말 좋았다. 영화 자체는 무거웠지만 이준익 감독님은 항상 밝고 강하게 웃자는 주의시다. 최고의 현장에서 스태프도 정말 좋았고 모두 마음을 다 해서 ‘소원’을 찍는 게 보였다. 영화 기술시사때는 업무적으로 오지 않아도 되는 스태프 분들도 대부분 영화가 보고 싶어서 왔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원’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찍은 작품이라는 것을 느꼈다.
Q. 끝나고 많이 아쉬웠을 거 같다.
엄지원: 여운이 짙게 남았기 때문에 모두 이 영화를 쉽게 떠나보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하면 또 감정이 북받친다. 촬영 자체는 행복한 현장이었고 즐거웠다.
Q. 그러고 보니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도 김해숙 선생님과 다시 만났다.
엄지원: 김해숙 선생님은 연기적인 멘토, 어머니시다. ‘소원’은 내가 아직 모르는 어머니의 마음을 표현해야 하는 도전, 숙제 같은 작품이었다. 그런데 해숙 선생님이 계시니까 든든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항상 장면이 끝나면 눈으로 서로 괜찮은지 확인 하고(웃음). 그 외에도 내가 미희가 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많았다. 경구 오빠, 김해숙 선생님, 미란 선배님 없이 혼자 미희를 하라고 했으면 지금 ‘소원’의 미희와 다른 미희가 나왔을 거다. 내가 한 것 같진 않다(웃음).
Q. 2년 전에 이 영화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을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송윤아씨의 추천으로 출연을 결심하게 됐다. 무엇 때문에 마음이 변했나.
엄지원: ’이 불편한 것을 내가 해야 하나?’ 싶었다. 엄지원 보다는 결혼하고 아이가 있는 배우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2년이 지나고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를 하고 있을 때, 이 작품을 송윤아씨가 추천해줬다. 머리 속에 갑자기 ‘그때 그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시나리오가 왔는데 ‘그거’였다. 읽어보기도 전에 이 작품은 나한테 올 작품이라는 느낌이 쑥! 왔다. 이준익 감독님이 오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로 중심이 맞춰졌다.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이 따뜻하고, (시나리오를) 덮었을 때 좋은 영화라는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부족할지 모르지만 잘 해보고 싶었다.

엄지원: 되게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다. 배우가 작품에 들어갔다가 일상을 찾기까지 몸부림이 있다. 마음이 이상하고 붕 떠있는 느낌에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훈련을 걸쳤다. 잠을 푹 잔다든지, 여행을 간다든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Q. 얼마 전에 홍콩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홍콩여행은 회복하는데 큰 도움이 됐나.
엄지원: 드라마 ‘무자식 상팔자’가 끝나고 남미 여행을 다녀왔다. 그리고 ‘소원’을 하게 됐는데, 끝날 때 쯤 다음 작품이 들어왔다. 회복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준비에 바로 들어갔기 때문에 힘들었다. 그런데 드라마가 딜레이 되면서 이대로 있다간 안 되겠다 싶어서 홍콩 여행을 떠났다. 뭐가 정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로.
Q. 벌써 10월이다.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나.
엄지원: 바람? 시간 너무 빨리 가는 거 같다(웃음). 아무래도 올해는 ‘소원’만 생각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 감독, 배우들이 좋은 마음으로 욕심 내지 않고 진심으로 만든 영화이다. ‘소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다. 보고 나면 느끼는 따스함을 전해주고 싶다.
글. 이은아 domino@tenasia.co.kr
사진. 구혜정 photonine@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