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도 마음도 건강하지 못 한 데다 심지어 게으르고 편협해서 집 앞에서 이름을 부르며 놀기를 청하는 친구보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친숙했던 어린 시절의 어느 날부터 영화에 대해 글을 쓰며 제가 가진 언어의 빈곤함에 좌절하는 지금의 어느 날까지,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는 그 날들이 그렇지 않았던 날들보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구해준 삶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지탱했던 ‘영화로운 날들’과 그 날을 열어 준 고마운 이들에게 띄우게 될 이 연서들은 결국 부끄럽게 움켜진 제 손 위를 감싸준 당신의 온기가 전해주는 다정함에 기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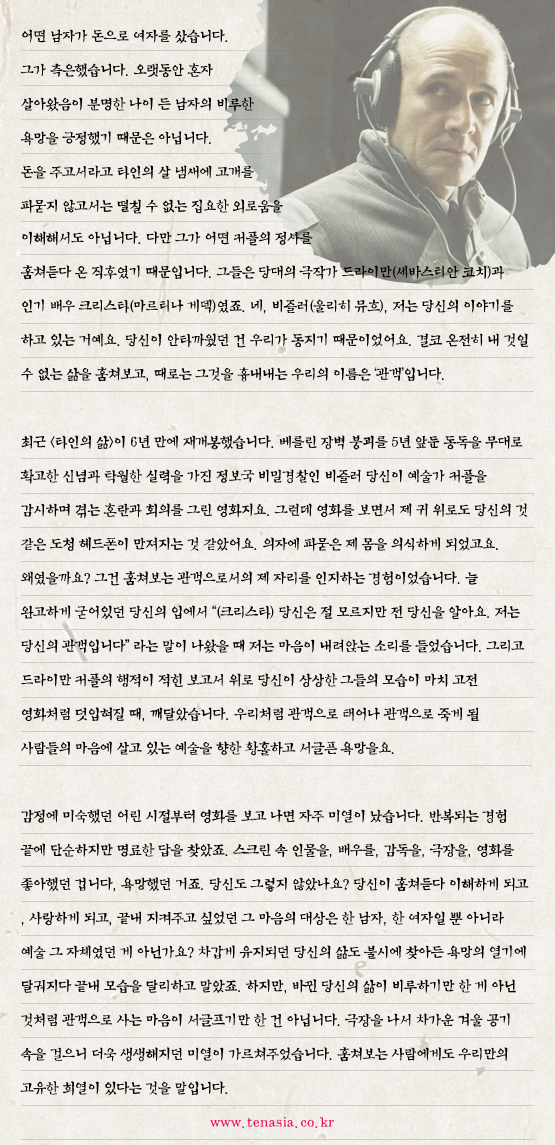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봉 D-day '범죄도시4' 사전 예매량 83만…한국영화 역대 최고 기록[TEN이슈]](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310272.3.jpg)
![[공식] '열혈사제2' 김남길·이하늬, 다시 뭉쳤다…5년만 귀환에 벌써부터 '들썩'](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BF.3650916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