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구의 세종(이원희)이 신하와 악공들을 이끌고 병치료를 위해 행궁길에 나선다. 악천후 속 임금이 탄 수레는 언덕길에서 바퀴가 빠지며 그대로 땅에 곤두박질친다. 즉시 수레에 관여한 이들이 의금부에 송치되고, 4명의 관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느라 바쁘기만 하다. 사실 세종도 안다. 수레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바퀴가 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수레의 제작을 맡은 장영실(곽은태ㆍ강학수)을 비롯한 관리들에게는 끔찍한 형벌이 주어진다. 어째서 천체와 시간을 다루던 장영실이 수레를 만들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를 어여삐 여기던 세종은 왜 그의 고초에 눈 감았을까. 연극 는 그 빈틈에 대한 이야기다.

무대는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에는 우리가 알던 세종과 장영실이 없다. 다만 끊임없이 존재를 확인받고자 했던 두 인간만이 있을 뿐이다. 관노 출신이라는 신분을 자신의 기술로 뛰어넘고자 했던 장영실은 물론이거니와, 명나라와 사대주의 공신들 사이에서 자치 국가를 꿈꿨던 세종 역시 마찬가지다. 꿈을 꾸는 이와 그 꿈을 실현시켜줄 이. 세종과 장영실의 이 전략적인 관계 안에는 인간의 존재증명과 계급, 정치에 이르기까지 묵직한 질문들이 산재해있다. 언어부터 음악, 천체의 위치에 이르기까지 조선을 중심에 세우고자 했던 세종마저도 명의 견제에 장영실을 수레제작꾼으로 만들었고, 신분제를 철저히 주장했던 영의정 황희의 정치적 압력에 그를 방면하지 못했다. 안의 세종은 자치에 실패했다. 대신 장영실은 자신의 도면으로 만든 측우기마저 “명의 하사품”으로 전략해버린 것을 알게 된 순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신의 운명과 그저 그런 자신을 위해 살겠다는 의지를 각성하며 진정한 ‘자치’를 이룬다. 하지만 의 가장 씁쓸한 지점은 그 자치가 결국 소멸로 일궈낸 것이라는 점일지도 모른다.해시계를 형상화하여 1, 2층으로 구분지어진 무대에서 펼쳐지는 장면들은 압도적이다. 특히 무대에 실제 비탈면을 만들고 20여명의 배우들이 세종을 받드는 수레가 되어 추락하는 오프닝은 ‘세종은 영실을 비롯한 수많은 민초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는 연출의도를 직접적으로 그려내고, 소멸의 길에서 장영실의 머리 위로 펼쳐지는 천상열차분야지도는 초월적인 힘을 느끼게 한다. 수많은 콘텐츠가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 는 무대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내어놓는다. 예순하나의 이윤택 연출가는 여전히 지금 여기를 산다. 현재 13일에 종료되는 서울 공연은 전석 매진되었고,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5/18~5/20)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5/24~6/3)에서의 재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사진제공. 국립극단
ADVERTISEMENT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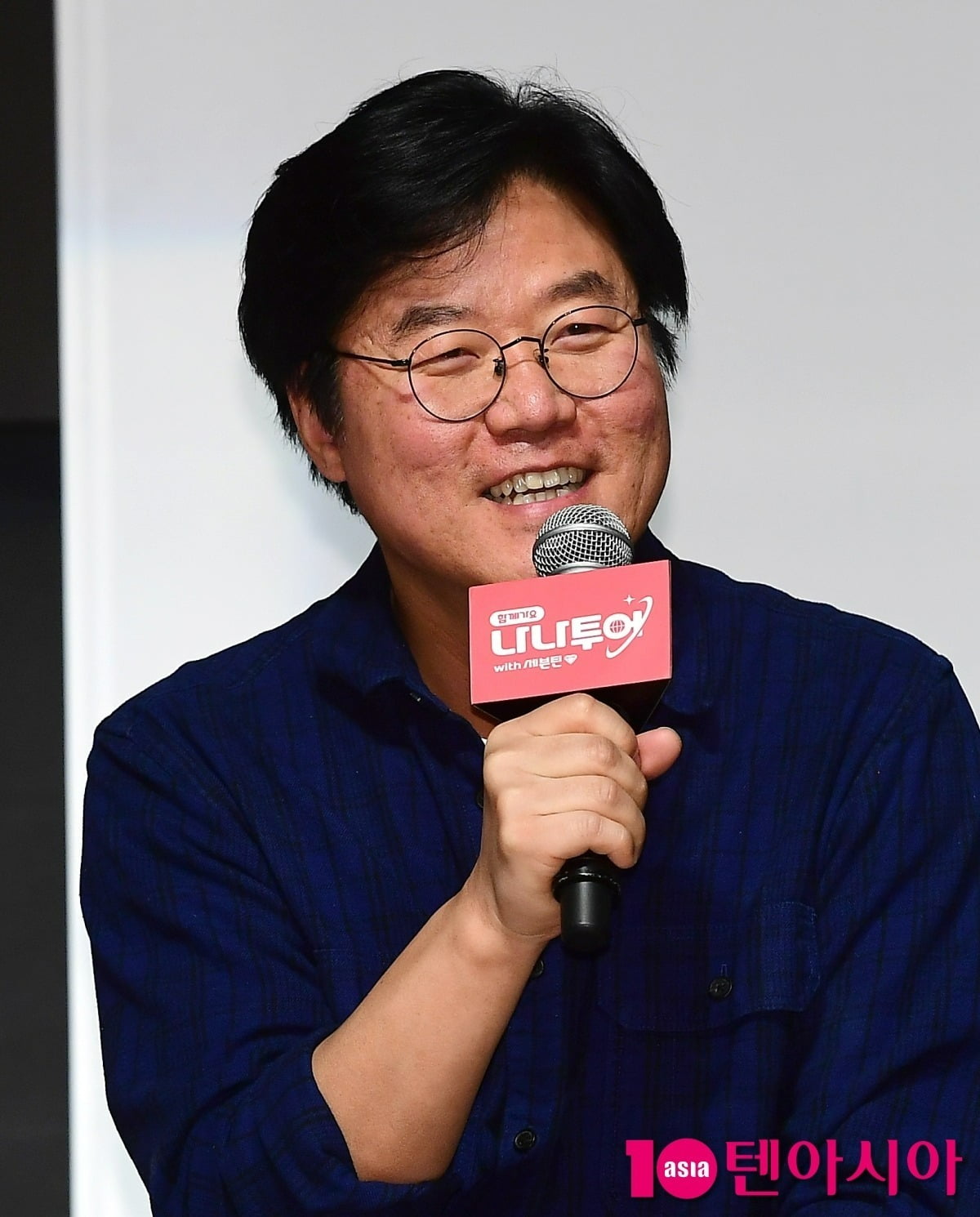

![있지 예지, 아름다운 고양이상[TEN포토+]](https://img.tenasia.co.kr/photo/202506/BF.40764618.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