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3년 4월 2일생.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02학번
초등학교 때 형 방에서 흘러나오던 기타 소리를 계기로 너바나에, 록에, 음악에 빠지게 됐다. 형 역시 내가 계속 음악 하는 걸 좋아한다. 녹음단계 때 믹싱 되지 않은 곡을 들려주기도 했는데 많이 응원해준다.
입학 첫 주, 태현이 형을 처음 본 순간은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깜깜한 저녁에 3층 건물 옥상에 올라갔는데 형이 난간에 누워 자고 있었다.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는 데서 이 형이 1학년 1학기 15주 동안 11주 정도 입고 있던 청바지랑 후드T, 컨버스 차림으로 다리 꼬고 누워 있는 거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 보니 맨날 붙어 다니고 있었다.
시온이의 기숙사 방에 몇 달 얹혀 산 적이 있다. 안산에 있는 학교와 서울 집을 오가기 귀찮아서 청소 같은 걸 해 주기로 하고 들어갔다. 한 평짜리 화장실을 락스로 두 시간 동안 닦고 방도 깔끔하게 치웠는데 어느새 네 명이 같이 살고 있었고 특히 시온이가 어지르기의 스페셜리스트라 감당할 수가 없었다. (유승범: 이불을 한 번도 갠 적이 없어서 방 뺄 때 이불 밑에서 잃어버렸던 물건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내 공연 영상을 보는 것과 연기한 작품을 모니터하는 것 중 더 고역인 건 전자다. 연기에 대해서는 내가 무서워하는 연기자 두 사람이 내 작품을 보고 지적을 하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분석해서 고치려고 한다. 그래야 나도 그들의 작업을 보고 까댈 수가 있다. (웃음) 그리고 음악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 걸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반면 드라마는 제작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좀 더 잘 표현하려면 모니터가 필요하다.
정말 작은 클럽에서 공연해 보고 싶다. 조명도 무대도 열악하고 관객이 침 뱉으면 나한테 닿을 정도로 좁은, 관객 중에는 온전히 나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만취해서 정신없는 사람도 있는 곳. 거기서 중요한 건 밴드도 관객도 아니고 오로지 음악이라는 분위기가 진하게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데서 한 번 공연하면 정말 자유로운 기분일 것 같다.
일이 없는 날 기상 시간은… 사실 기상이 문제가 아니라 정오쯤에 취침한다는 게 문제다. 한동안 보느라 낮과 밤이 바뀌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봤기 때문에 좀 일찍 일어나서 많이 돌아다니려고 한다.
술을 아주 많이 마시는 멤버는 없지만 다들 좋아는 한다. 얼마 전 2리터짜리 와인을 세 팩 사 왔는데 시온이가 다 마셨다. 나는 한 모금도 못 먹고! (양시온 : 와인이 몸에 좋다고 해서…)

1981년 11월 21일생.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02학번
처음 스틱을 잡은 건 열여덟 살 때다. 재욱이는 단대부고 밴드 ‘각시탈’ 출신이고 나는 경복고 밴드 ‘각시탈’ 출신인데 친한 동네 형 겸 학교 선배가 다짜고짜 ‘네가 여기서 드럼을 쳐야겠다’고 해서 시작했다. 인근 여고와의 대면식 같은 떡밥도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공부하기 싫어서 치기 시작했다.
당시 우리는 유행하는 음악은 다 했다. 우리 세대 밴드 애들 사이에선 네오펑크, LA 메탈이 인기였고, 다들 그랬겠지만 당시만 해도 X-JAPAN이 우리에겐 신이었다.
스물 두 살 때 대학 신입생이 됐다. 반항기가 덜 끝나다 보니 고 3 때 너무 열심히 놀아서…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고 3 때도 열심히 했는데,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다시 하고 워낙 재능이 없어서 1년 더 걸렸다.
재욱이는 기억 못하지만 난 신입생 OT 때 재욱이를 처음 봤다.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는데 모델 출신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워킹 해 봐라 어쩌고 하는 주문을 했다. 겨울이라 다 똑같은 과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재욱이가 일어나서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뒤를 돌아 잠바를 확 제끼면서 포즈를 잡는 거다. 그 때 생각했다. ‘아, 쟤랑 놀면 재밌겠다’.
무대와 음반은 분야가 다르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마스터피스를 내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지만 지금은 라이브를 더 하고 싶고 재미있다고 느낀다. 라이브로 관객과 호흡하는 게 록밴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길인 것 같다.
월러스의 스타일과 비주얼적인 부분의 권한을 모두 재욱이에게 넘겼다. 얘가 멋있으니까 우리도 멋있게 만들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난 후드 T에 늘어난 청바지로 이십 년을 넘게 살았는데 재욱이랑 같이 살면서 조언을 얻은 뒤로는 어디 가서 옷 못 입는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 없다. (김재욱: 태현이 형과는 사이즈가 같아서 모든 옷을 공유할 수 있다. 오히려 옷걸이나 비율로 보면 형이 나보다 훨씬 모델에 가깝다.)
짐 모리슨을 너무 좋아해서 영화 를 천 번 정도 봤다. 워낙 좋아하는 밴드고 내가 닮고 싶은, 니체 같은 사람들을 모티브로 음악을 한 사람들이라 음악적인 면을 떠나 사상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존경한다.

1984년 1월 11일생.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02학번
어릴 때 어머니께서 피아노를 가르치셨다. 그 때부터 작곡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클래식은 너무 연습을 많이 해야 하니까 울면서 피아노 치기 싫다고 한 적도 있고, 피아노가 워낙 어려운 악기다 보니 입시철 즈음 베이스를 시작했다. 줄이 가장 적다는 이유로…
재욱이를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잘 생겼다’고 생각했고, 태현이 형은 ‘저 형이랑 마주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했다. (웃음) 너무 무서웠다. 지금은 눈빛이 많이 선해졌는데 그 땐 머리도 훨씬 더 길고 완전히…살인자의 눈을 하고 있었다. (김태현: 인정한다.)
스무 살 넘어서 지미 헨드릭스를 처음 들었다.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아, 이게 내가 연습 안 하고 잘 할 수 있는 음악이구나’ (웃음) 어떤 느낌이나 에너지만으로 음악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걸 그 때 처음 알았다.
밴드 활동과 세션을 쭉 해왔기 때문에 천 명 이상 되는 관중 앞에서 공연한 경험은 많다. 하지만 얼마 전 재욱이의 일본 팬미팅에서는 ‘나의’ 밴드로 처음 수많은 관중 앞에 서는 거다 보니 첫 곡 들어갈 때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질 정도였다. 좋은 경험이었다.
재욱이 집 TV 앞에는 DVD가 2백 장 정도 있는데 각자 방에서 놀다가 새벽 두세 시쯤 누군가 영화를 틀면 스물스물 그 앞으로 모인다. 같이 극장에 갈 때도 있다. 얼마 전에는 재욱이, 태현이 형과 을 봤다.
난 아직도 내가 천재라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좌절감은 있어본 적이 없다. 단지 마음에 걸렸던 건 (커트 코베인이 요절한) 스물 일곱이란 나이였다. (웃음) 난 스물 일곱에 죽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젠 그 나이를 넘었다. (김태현: 요즘 시온이가 존 레논 흉내를 그렇게 낸다. 마흔 하나가 고비라며.)
U2의 앨범은 지금 들어도 항상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았던 브라이언 이노의 음악 방식을 정말 좋아하고, 내가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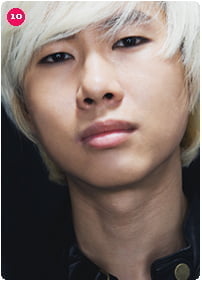
1982년 5월 14일생.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01학번
고등학교 때 어느 날, 반 친구가 꽂아 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게 너바나 음악이었다. 바로 낙원상가에 기타를 사러 갔다. 그리고 기타를 배우러 소개받아 간 곳이 백두산의 연습실이었다. 원래는 취미로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치고 있으면 김도균 씨가 옆에서 주무시다가 소리가 끊기면 일어나셔서 계속 치라고 하시고, 손가락에 피 나면서 스파르타식으로 배웠다. (웃음)
내가 천재가 아니란 걸 깨달은 건 음악을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였다. 충격은 없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는 거고, 재능이 모자라더라도 노력해서 뭔가를 이뤄갈 때 느끼는 기쁨이다.
가장 좋아하는 앨범은 흔히 말하는 ‘쌍팔년도 메탈’인, 화이트 스네이크라는 밴드의 앨범이다. 사실 지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많이 들은 건 94년에 나온 베스트 앨범이다. 너무 옛날 같지도, 너무 요즘 같지도 않고 딱 94년의 사운드라는 느낌이 든다.
우리 집에서 자전거 타고 쓱 내려가면 바로 재욱이네 집이 나온다. 나는 평소에도 말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 애들 모여 있다고 하면 그냥 간다. (김재욱: 야쿠르트 아줌마 같다. 하루 한 번 전화해서 “집에 있니…?” 그러고 와선 조용히 만화책 보고 있다.)
몇 달 전 재욱이가 “형 머리 노랗게 만들어도 돼?”라고 물어서 “응!”이라고 대답한 결과가 지금의 헤어스타일이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어른들이 혀를 차시거나 따가운 시선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이십 대 초반에는 긴 분홍색 머리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견딜 만하다. 새로운 데 익숙해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어도 지나고 나면 예쁜 것 같고.
공놀이, 특히 농구를 좋아하는데 기타 치는 애가 맨날 농구 하다 손가락을 다치니까 집에서 공 만지면 어머니가 무섭게 쳐다보신다. 한동안 추워서 못 했는데 날 풀리면 해야지. 인터뷰, 글. 최지은 five@
인터뷰. 위근우 eight@
사진. 채기원 ten@
편집. 장경진 three@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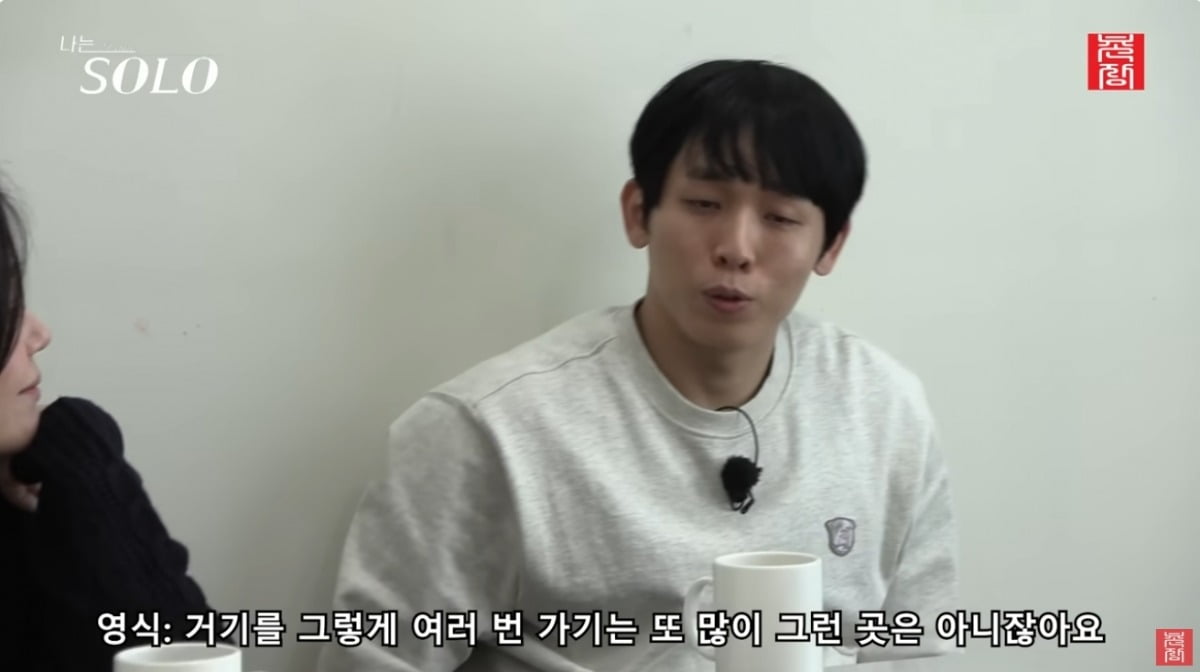

![손연재, 출산후 예뻐진 워킹맘...아름다운 미소[TEN포토+]](https://img.tenasia.co.kr/photo/202506/BF.40816494.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