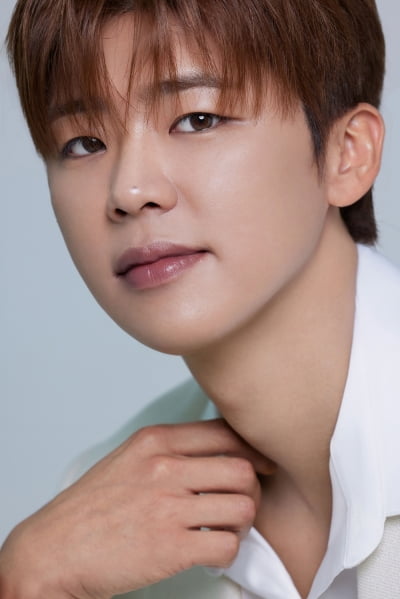오대수라면 그들의 마음을 알까인류 마지막 생존자들이 올라탄 설국열차. 17년째 멈추지 않고 달리는 기차에서 ‘꼬리칸’ 사람들에게 제공된 건 흔들면 출렁거리는 갈색의 네모난, 일명 ‘단백질블록’이라 명명된 것이었다. 15년간 만두만 먹은 ‘올드보이’ 오대수라면 그들의 마음을 알까. 적어도 오대수는 자신이 무얼 먹는지는 알았다. 하지만 이들은 이 정체불명의 요상한 음식이 어디에서 나서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랐다. 아니, 어쩌면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어째서?
‘설국열차’를 향한 해석은 차고 넘치지만, 내 눈에 비친 ‘설국열차’는 결국 ‘먹고사니즘’에 대한 영화였다. 살기 위해 서로를 도륙해 먹으며 목숨을 연명했던 이들에게 이념이니, 계급이니, 진보니, 보수니, 그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오랜 시간 방치된 미각을 슬퍼하며, 아아 그리워라 그 맛, 회한에 젖는 사람들. 이건 본능에 대한 이야기다. (*이 글에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꼬리칸 리더 커티스(크리스 에반스)는 말한다. “가장 혐오스러운 게 뭔 줄 알아? 내가 사람 맛을 알았다는 거. 그것도 아기가 가장 맛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려면, 과거를 살펴봐야 한다. 꼬리칸 사람들은 무임승차한 자들이다. 설국열차 창조주 윌포드(에드 해리스)는 초대받지 못한 이들을 기차 끝에 몰아넣고 외면했다. 갇힌 사람들은 굶주렸다. 배가 고파 미칠 것 같았다. 아사 직전에 이르자 서로가 서로의 육체를 잡아먹기 시작했다. 지옥이었다. 무리 중 한명이 자신의 팔을 잘라 식량으로 내 놓았을 때, 사람들은 ‘아차’ 했다. 짐승은 되지 말자. 한 사람, 두 사람, 자신의 신체일부를 식량으로 내놓기 시작했다. 서글픈 참상은 월포드가 단백질블록을 배식해 줄때까지 계속됐다. 이것이 꼬리칸이 지닌 슬픈 사연의 전말, 그리고 단백질블록이 이들에게 지니는 의미다.
ADVERTISEMENT
‘설국열차’ 단백질블록
하지만 단백질블록은 ‘손이 가요, 자꾸만 손이 간~’다는 새우깡이 안타깝게도 아니었다. 맛도 생김새도 고약했다. 그래서 갓난아기 때 열차에 올라 탄 에드가(제이미 벨)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스테이크 향을 상상할 때 커티스는, 어쩌면, 바로 옆 동료들에게서 나는 살갗의 풍미를 상상했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단백질블록 이전에 인육을 맛본 자의 슬픈 운명이다.그래서였을까. 도끼로 진압군의 신체를 사정없이 긋고 찌르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커티스가, 심지어 인육까지 먹었던 커티스가, 단백질블록의 정체인 바퀴벌레를 확인하곤 그토록 경악한 건. 그건 혐오스러워서가 아니다. 슬퍼서다. 징그러워서가 아니다. 지난 세월에 대한 열패감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바꾸려하는 이 기차의 시스템이 생각 이상으로 조직적이고 비인간적으로 짜여있음에 가시 돋는 전율을 느꼈기 때문이다.
윌포드 입장에서는 “바퀴벌레라도 없었다면, 너희들은 이미 다 죽었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단백질블록을 제조하는 사나이와 자신과 모종의 뒷거래를 하고 있었던 길리엄(존 허터)도 군말 없이 단백질블록을 먹었다는 걸 근거로, 바퀴벌레가 별 탈 없는 제품이라 주장할 수도 있을 거다. 일리 없는 건 아니다. 단백질 뿐 아니라 칼슘도 함유하고 있는 바퀴벌레는 위생적으로 관리만 잘 해 주면 좋은 양식일 수 있다. 생존력에 있어서만큼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게 또 바퀴벌레다. 키우기 쉽고 번식도 빨라서 장기간 생존해야하는 극한 상황에선 안성맞춤 식량이 될 수 있다.
ADVERTISEMENT
배반의 아이콘이 된 양갱?
tvN ‘SNL코리아’ 캡처, 설국열차 단백질블록 패러디
‘설국열차’ 개봉 후 단백질블록을 향한 관심이 기대이상으로 뜨겁다. 포털 인기검색어 1위 등극, 각종 패러디, 레시피 공개 등, 최근엔 영화를 관람한 한 네티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단백질블록 관련 글을 올렸다가, 한 제과업체로부터 게시중단 요청을 받는 해프닝이라면 해프닝이라 할 일도 있었다. 우리는 왜 이리도 단백질블록에 주목하는가. 바퀴벌레로 만들어진 혐오식품이라서? 아니다. 단백질블록의 형상이 한국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음식에 대한 기시감을 불러일으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또 우리가 상상했던 이미지를 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단백질블록이 연상시키는 것은 양갱, 추.억.의.먹.거.리.양.갱.이.다. 너도 먹고, 나도 먹고, 우리 아부지 어무니도 먹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먹었던, 한 입 베어불먼 소리 없이 입안에 착 달라붙는 그 달콤함 팥이 든 양갱 말이다.ADVERTISEMENT
글. 정시우 siwoorain@tena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