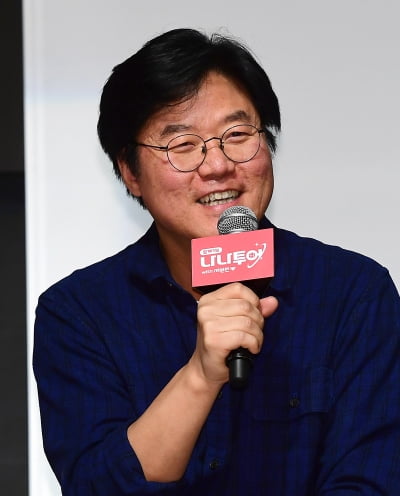1983년 11월 9일에 태어났다. 어렸을 때 생각했던 서른 살과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서른이면 결혼하고 아이도 있고 아파트에 살고 차도 있고 뭐 그런 안정된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위 친구들을 봐도 실상은 정말 다르니까.
그래서 영화 의 “젊은 사람이 좀 살아 보겠다는데” 라는 대사가 기억에 많이 남는다. 영화 속 윤호와 내가 직업이 다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행동 방식이 달라서 그렇지 요즘 내 나이 또래 사람들은 다들 똑같은 처지인 것 같다. 뭘 해보려고 해도 다들 어렵고 꿈은 있지만 아직 시작하지 못 했고, 각자 속 안에 고달픔을 안고 있는 게 비슷한 것 같다.
드라마 첫 주연작인 의 준감독은 몸 쓰는 게 익숙한 나와 달리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대사도 길고 현학적인 표현도 많이 쓰지만, 그래도 박현석 감독님이 내가 갖고 있는 부분을 많이 넣어주시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배려해주셨다.
박현석 감독님의 모든 단막극을 함께 했다. 감독님의 입봉작이었던 드라마 스페셜 의 해결사 역이 나의 드라마 데뷔작이었다. 오디션에서 자유연기로 독립영화 대사를 했는데 연기보다 독립영화를 해 온 열정이 마음에 드셨다고 하더라. 감독님 덕분에 드라마 현장도 경험하고 다양한 역할을 해볼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연기는 얼짱이던 교회 친구의 권유로 시작했다. 당시 나는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같이 연기학원을 다니자고 했다. 내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는 걸 걱정하시던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시면서 학원도 알아봐주시고 밀어주셨다.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미술학원을 끊어서 지금도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엄마가 학원비를 주면서 “원빈보다 더 떠야 돼”라고 하셨던 게 아직도 안 잊혀진다. 당시 가 한창 유행일 때여서. 나는 아무 것도 아니고 생긴 것도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까 싶으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다. 그래서 학원을 갔는데 나도 모르게 최선을 다 하고 있더라.
영화감독 엄태화가 형이다. 나도 배우로 참여한 이라는 작품으로 올해 미쟝센 단편영화제에서 대상을 받았다. 에서 준감독이 “야, 솔직히 엄태화가 나보다 잘 찍어?”라고 형을 언급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되게 오글거렸다. (웃음)
이후로 일이 잘 풀린다. 그 전에는 8개월 정도 일이 없어 연기 그만두고 격투기를 할까 생각도 했다. 막노동, 행사 알바, 빵집 알바, 연기 과외 등 이런저런 일을 했다. 빵집 알바 하던 중에 영화 택배기사 역을 하게 돼서 형한테 알바를 부탁하고 갔다.
역시 형이 연출한 단편영화 의 노숙자 역은 원래 다른 배우가 캐스팅 되었는데 머리를 못 자르겠다고 해서 내가 하게 되었다. 솔직히 그 역할을 하려는 배우가 아무도 없었을 거다. 나도 좀 그랬는데 그 때 형 모습이 좀 안쓰러웠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 요즘 형이 상도 받고 잘 되고 있어서 좋다.

의 태구나 학교 일진 같이 동물적으로 움직이고 몸을 쓰는 역할은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그런데 의사라든지 머리 쓰는 역할은 너무 약하다. 같은 형사라도 몸 쓰는 형사는 되는데 추리하고 분석하는 건 되게 약하다. 그런 부분의 연기 근육을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한석규 선배님을 존경하고 좋아한다. 더도 덜도 아닌 딱 맞는 그 만큼의 연기를 하는 경지라니.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스태프들한테도 되게 잘 하시는 것 같다. 발성도 되게 좋으시지 않나. 나는 목소리가 콤플렉스라서 더 대단하게 느껴진다.
허스키 한 목소리는 목을 혹사해서 이렇게 된 것 같다. 5년 전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제대로 안 먹으면서 연습을 계속 해서 목이 쉬었다. 목소리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다. 대사 전달의 문제도 있고 듣는 사람이 거북할 수도 있다고 판소리를 배워보라는 조언을 들어서 한 번 해보려고 한다.
어눌한 말투는 예전에는 더 심했는데 되게 많이 고친 거다. 스무 살 때 누가 TV에 너랑 똑같이 말 하는 사람 있다고 해서 봤더니 양동근 씨였다. (웃음)
사람을 많이 만나는 편은 아니다.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같이 커피숍에서 수다 떠는 걸 좋아한다. 바닐라 라떼 마시면서 얘기하는 게 그렇게 좋다. (웃음)글. 김희주 기자 fifteen@
사진. 이진혁 eleven@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종합] '문희준♥소율 딸' 잼잼이, 벌써 소속사 생겼다…"아빠는 좀 쉴게" ('재미하우스')](https://img.tenasia.co.kr/photo/202505/BF.40362813.3.png)